
시인의 첫 청소년 시집이라기에 처음 나온 시집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읽어갈수록 그 깊이와 경험이 결코 첫 시집이 아님을 느꼈다. 그렇다. 나만 몰랐을 뿐, 유현아 시인은 이미 많은 시집을 출간한 경험 많은 시인이었다.
시는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생생하고 뜨겁다. 내가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 대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내가 쓴 것 같은 기시감을 준다. 시 한 편 한 편이 타임머신이 되어 나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로 돌려놓는다.
규조토 같았던 내 마음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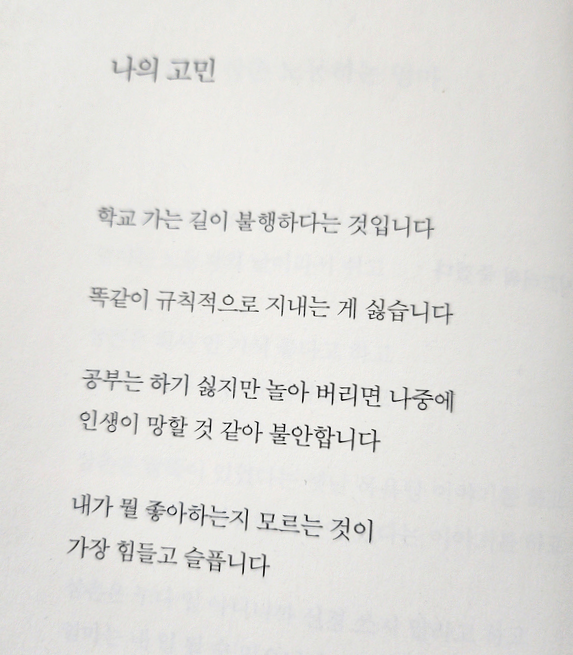
시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험과 마음을 담고 있다. 이는 가정 형편 때문에 상업 고등학교로 진학해 십 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저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창작자의 진솔한 경험이 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더욱 공감이 간다.
나는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되어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실업계 고등학교와 유사하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내 친구 중에는 여상을 다니며 은행에 취직해 내가 대학에 입학한 해에 엄청난 적금을 자랑했던 친구가 있었다. 사촌 언니도 상고를 나와 일찍 취업해 친척들보다 높은 월급을 받았다. 당시 나는 실업계 출신들에 대해 일찍부터 자립하는 존경심을 느꼈기에 차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대학 진학률이 높았던 세대였고, 대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지금도 실업계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십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현실이 존재한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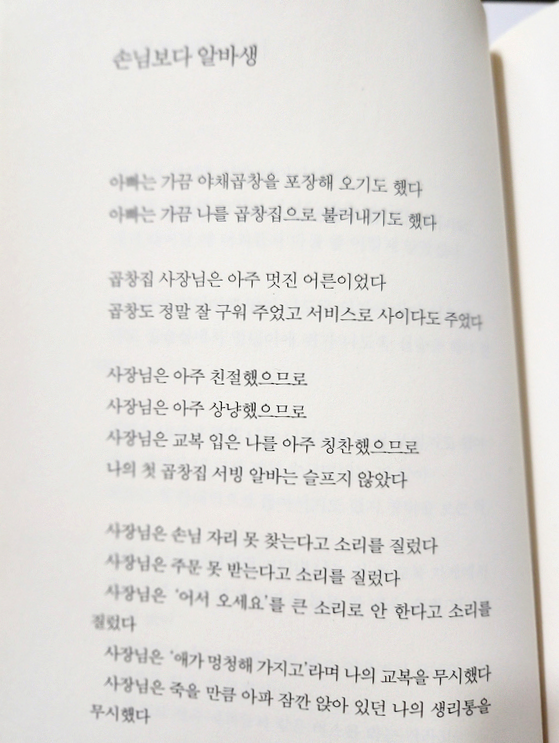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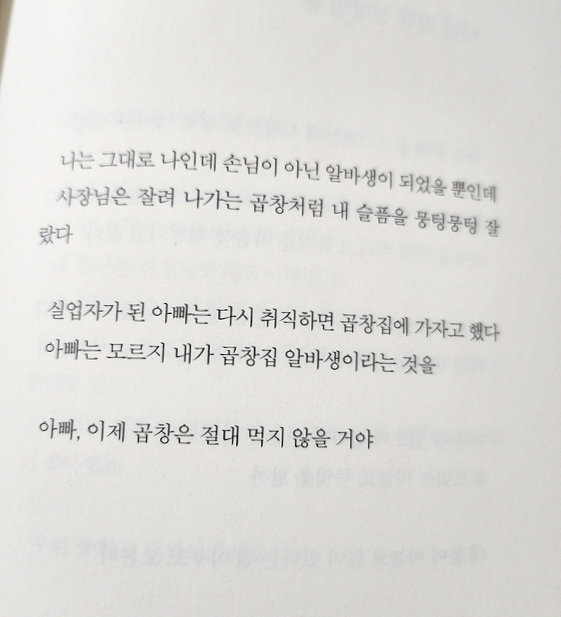
시집을 읽으며 요즘 특성화고의 현실을 알아보게 되었다. 특성화 고등학교 정책이 당면한 복잡한 현실, 최저임금과 근로 복지를 둘러
싼 이슈 속에서 '고3 직장인'들의 노동 현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 시집은 단순히 학벌로 인한 차별을 다루지 않는다. 특성화고에 다니며 학교와 사회 양쪽에 서 있는 십 대의 전반적인 삶을 담고 있다. 진로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고민도 깊다.
시를 읽는 동안 나는 자꾸 착각하게 되었다. 정말 고등학생이 쓴 것이 아닐까? 수업 시간에 낙서한 글 같기도 하다. 너무 궁금해서 유현아 시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녀가 십 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여전히 오늘날의 십 대의 현실적인 단상들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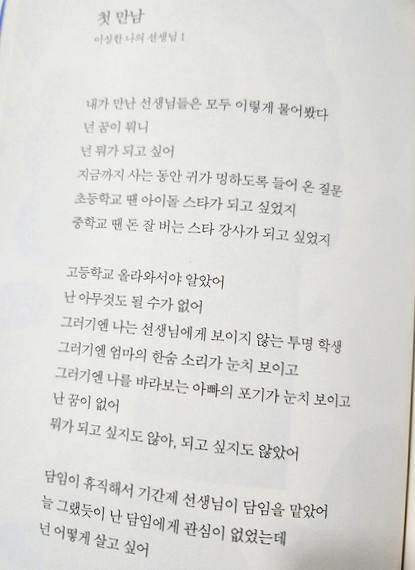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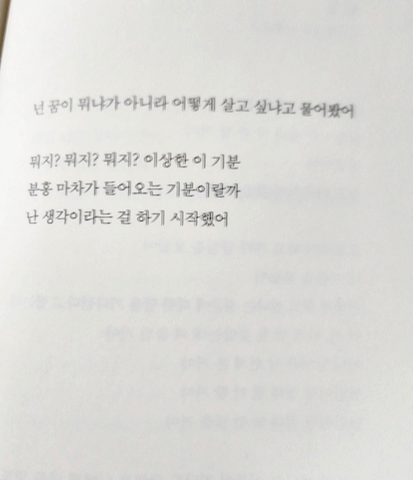
시집의 제목에는 '주눅'이란 단어가 들어있다. 시의 주인공은 특성화고로 인한 주눅을 다루지만, 나는 모든 연령대가 각자의 이유로 '주눅'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시는 귀엽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주눅이 우울이 되어버린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나라다.
시들은 삶의 현장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마음들로 가득하다. 시를 찾는 것은 내가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슬픔이나 애석함에 집중한다면 평소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이 있다는 반증이 된다.
시집 마지막에 실린 ‘시인의 말'에서 시인은 다시 십 대로 돌아갈 거냐는 물음에 단호히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슬펐고 외로웠고 아팠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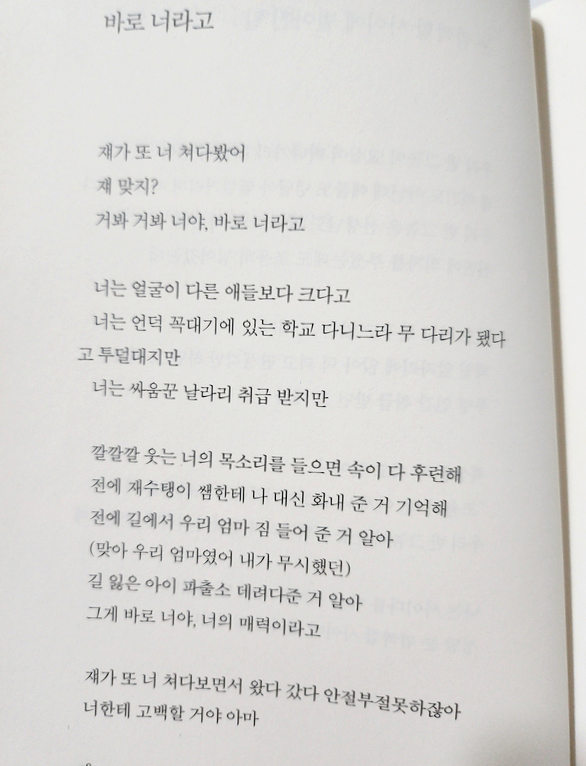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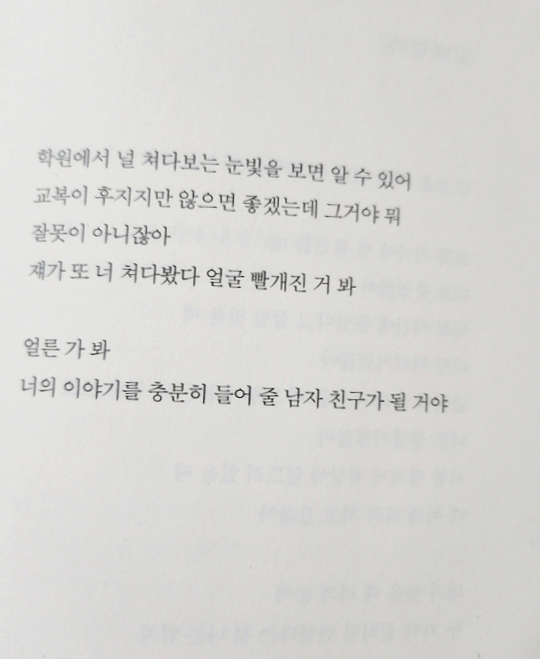
일상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시 속 아이의 혼잣말은 지금 내 나이에도 해결되지 못한, 달라지지 않은 현실의 진행형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는 자동화된 낙심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슬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고, 누구나 그렇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 확인이 오히려 위안을 준다.
그런 시기들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기에 그것은 '보통 인간'이라는 행운을 가진 증거다. 시를 읽는 동안 공감을 했다면 그 자체에 감사하자. 내가 아직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아팠던 마음들도 이처럼 솔직하고 예쁜 단어들로 포장해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집’을 인생의 중반을 향해가는 나이에 읽어도 풋풋하고 설레고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철들지 않은 나 자신에 감사했다.



